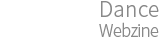춤, 현장
I
“춤꾼들 다리 사이로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인다.”
이 지구상에 항구도시, 해변 도시에서 열리는 춤 축제는 꽤 있다. 그러나 부산국제무용제(이하 BIDF)처럼 해변 모래사장에 특설무대를 만들어놓고 열리는 춤 축제는 부산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
관람자가 자세를 조금 높여 앉거나, 관객석 옆이나 뒤에서 서서 관람하면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양다리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무대를 만들어놓았으니 발아래로 고운 모래를 밟으면서 관람한다. 관객은 자연친화적인 색다른 느낌을 받는다.
무대를 크게 확장해서 보면 오른쪽에는 숲을 이룬 동백섬. 그 섬에 ‘웨스틴 조선호텔’이 불을 밝힌다. 왼쪽 멀리는 부산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마천루들이 조명등 역할을 한다. 특설무대 뒤로 보이는 하늘과 바다가 배경이다. 하늘은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구름이 떠 있으면 떠 있는 대로 그럴듯한 무대배경이 된다. 멀리 연안을 오가는 두, 세 척의 크루즈선들은 움직이는 무대미술 효과를 발한다. 공식초청작들의 공연이 오후 6시에 시작되어 9시까지 이어지는 동안, 저녁은 밤으로 바뀐다. 밤바다 위, 크루즈 선들의 조명등들이 선명하게 반짝이면 더욱 효과적인 무대미술이 된다. 완전히 신이 설계한 무대 디자인이다.
그런 환상적인 무대 위에서 한국전통춤 여자 춤꾼들이 춤을 출 때면 그들은 선녀나 여신처럼 보인다. 여러 나라에서 온 무용수들이 현대춤이나 그들 나라의 고유한 춤을 출 때는 춤에 파도치는 바다가 어우러져 박진감을 더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자연의 에어컨이다.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 위 특설무대 같은 무대가 세상에 어디 또 있으랴.

|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BIDF) 개막식 ⓒ부산국제무용제 |
II
“바다가 춤추고, 사람들도 춤추는 곳. 이곳은 부산!”
다른 개막식에 참석하면 내빈 소개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정치인들,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불필요한 말 잔치가 장황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BIDF의 개막식은 내빈 소개와 주요 인사의 축사가 간략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말 대신 춤이 개막을 알렸다. 신은주 운영위원장은 개막 선언을 한 다음, 불필요한 말 대신, 춤을 추었다. 그녀는 “우리 다 함께 춤을 추어요”라고 하더니 따라 하기 쉬운 춤사위를 자신이 본을 보여 가면서 5분간, 모두가 춤을 추도록 리드(lead)했다. 참석자 모두가 춤으로 시작한 개막식이 참신하고 인상적이었다. 이후 신은주는 적절한 시기에, 때마다 춤을 추어 무용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해변 특설무대에서 6월 6일 금요일과 7일 토요일 공연들의 끝에는 이틀 모두 필리핀 라 캐스텔라나(La Castellana) 지역에서 온 무용단이 〈빛의 춤〉(Bailes de Luces)을 추었다. 이 춤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 위원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휘황찬란한 춤꾼들 안에서 춤을 추니 수많은 부산 시민들, 외국인 참가자들이 따라 올라가 함께 흥겹게 떼춤을 추었다. 그 자체가 장관이었다.
7일 한바탕 〈빛의 춤〉이 끝난 다음, 모든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해운대 동쪽 끝에 있는 비어홀로 옮겨가서 생맥주 파티를 벌였다. 이때 또 화끈한 춤판이 벌어졌다. 각 나라 무용단별로 춤을 추었다. 이태리에서 온 무용단의 춤에 젊음의 정열이 넘쳤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마지막에 무용제 출연자들이 아닌 한국인 스태프들이 K-pop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비어홀이 요동치고 해운대 바다가 요동쳤다. 이렇게 이번 무용제는 위원장과 함께 바다가 춤추고, 춤꾼들이 춤추고. 관객들이 춤추었다. 모두가 춤춘 축제였다.
III
“운영위원장의 안목과 그 리더십”
수년 전까지 BIDF는 국내외적으로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평자도 10여년 전에 2~3번 참석했었지만 특별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오랜만에 이번에 와서 보니 무용제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다양성과 함께 내실 있게 활기를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무용제로서 손색이 없었다.
국내외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훌륭한 무용제라고 칭찬했다. 무엇보다 주로 부산 시민으로 이루어진 관객들이 만족스러워했다. 해운대 특설무대 공연이 끝난 뒤 관객석에서 “지금까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까지 들렸다. 그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 있겠는가?
신은주 위원장은 그녀 자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초청작품을 선정한다고 했다. 부대행사까지를 포함하면 30여 단체의 50작품, 총 40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그중 공식초청작은 한국을 포함하여 헝가리,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일본, 필리핀의 모두 18작품이었다.
그녀는 작품을 선정할 때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늘 고민한다고 했다. 국제무용제라면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춤의 흐름에 발맞추어 무용 전문관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한국 춤계에 자극을 주어 춤예술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일반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시민들을 관객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다. 국제무용제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춤 작품들을 세계인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또한 풍부한 춤 자산을 갖고 있는 한국전통춤을 외국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중견 무용가들의 도약을 기하면서 실력 있는 무용가들을 발굴하고, 젊은 무용가, 안무가들에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용가들과 협업 작업, 소위 콜래보레이션(Collaboration)으로 우리 무용가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시키면서 해외로 진출시켜야 한다. 국제무용제는 춤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BIDF에는 높은 점수를 줄 만했다.
신은주는 2022년 무용제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예술감독을 맡은 이래 빡빡한 예산과 몇 안 되는 상근 직원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무용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본래 그녀는 한국전통춤을 전공한 무용가였다. 그 자신 훌륭한 춤꾼이면서 창작춤을 안무하고 연출하는데 열성적이었다. 실제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발표하곤 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춤 예맥을 잇는 데서도 누구보다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이번 ‘부산 춤과 소리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제목 아래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수영야류, 동래학춤, 동래고무(북춤), 수영지신밟기를 관람케 한 것도 그녀의 부산지역 전통춤 사랑과 긍지, 주체의식에서였다.
그녀가 조타수 역할을 맡은 후부터 국제무용제 집행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역량을 발휘하리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했었다. 부산 출신인 그녀의 부산에 대한 애향심, 그로 인한 사명감과 함께 무용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과 문제의식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에 시작된 BIDF는 21년째로 이제 성년을 넘어선다. 나라도 그렇고 예술축제도 그렇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IV
특별초청된 헝가리 세게드현대발레단의 〈카르미나 브라나〉(Carmina Brana)가 6월 5일 저녁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공연으로 올랐다. 이어 6일, 7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더 공연했다. 6일과 7일의 해운대 특설무대에서 양일 각각 공식초청작 12작품이 공연되었다. 이중 일곱은 같은 작품이 양일에 겹쳐 공연되었다. 6일 해운대에서 공연되었던 이번 BIDF와 프랑스 칸의 공동프로젝트 작품인 〈하얀 밤〉과 〈No Matter〉 두 작품이 8일 마지막 날의 폐막작이 되었다.

|
세게드현대발레단 〈카르미나 브라나〉 ⓒ부산국제무용제 |
헝가리를 대표하는 안무가 타마스 유로니츠(Tamas Juronics)가 안무연출한 일종의 무용극인 〈카르미나 브라나〉(70분). “힘든 운명에 처한 젊은 여인이 사랑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통해 행복을 꿈꾸지만 그것도 잠시,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인간 존재와 삶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서사를 그린 작품이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배경음악이 된 카를 오르프(Carl Orff)의 24곡으로 구성된 칸타타인 Carmina Burana처럼 구체적인 줄거리보다는 젊음, 사랑, 본능, 쾌락, 운명의 덧없음 같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주제들을 에피소드처럼 춤으로 표현하는 비서사적 서정극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로니츠는 우선 춤, 군무로서 장면, 장면의 완성도를 기했다. 무엇보다도 무용수들이 뛰어난 기량의 농익은 춤을 춘다. 나는 공연을 보면서 한 순간은 앙리 마티스가 그린 명화, ‘춤(Dance)’을 떠올렸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한국의 이응노 화백이 말년에 많이 그린 ‘군상’ 시리즈, 사람들이 각자 제각각 춤을 신명 나게 추는 춤 그림을 연상하기도 했다. 안무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거대한 까만 옷을 입은 큰 거인으로 형상화한다든지 “오, 운명이여! 달처럼 너는 변덕이 심하도다”라는 〈카르미나 부라나〉의 시 구절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운명을 커다란 달로써 상징화해서 보여주어 관객에게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했다. 그러므로서 죽음을 뛰어넘어,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카르미나 부라나〉가 헝가리를 대표하는 춤 작품으로 유럽, 미국, 중동 등지에서 350여 회 공연을 했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
창무회 〈숨, 푸리〉 ⓒ부산국제무용제 |
공식초청된 한국춤 계열의 작품들, 창무회의 〈숨, 푸리〉, 최은희와 춤패 배김새의 〈하얀 섬〉, 김숙자춤보존회의 〈부정놀이춤〉은 한국창작춤이 되면서 현대춤 비슷해진 경향과는 다르게 세 작품 모두 전통춤의 색채가 뚜렷했다. 의상부터가 한국적이어서 좋아 보였다.
〈숨, 푸리〉는 한지와 신문지로 만든 지화를 들고 관객석까지 내려오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부정놀이춤〉은 무굿에서 맨 처음에 전승되어 온 그대로 춘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벽사초복’의 기원무(祈願舞)였다. 〈하얀 섬〉은 한국 여인들이 그리는 현실세계 너머 저편의 피안을 염원하는 춤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춤꾼들이 바다의 여신들 같았다. ‘정중동(靜中動), 동중정’이라는 한국전통춤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춤이었다. 역시 기원무의 성격을 담고 있었는데 한국의 이런 독특한 춤들이 외국의 춤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했다.

|
김용걸댄스시어터 〈바람, The Wind〉 ⓒ부산국제무용제 |
김용걸댄스시어터의 김용걸이 안무하고 안세원과 임재운이 춘 창작발레 〈바람, The Wind〉는 발레로서는 실험적인 작품이다. 우선 국악의 가야금 산조를 음악으로, 실제 바람 소리를 음향으로 썼다는 것이 파격적이다. 바람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나온 둘은 고즈넉한 산사에 부는 바람을 남녀 2인무의 발레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 ‘하시아구라(Hasyagura)무용단’의 〈위대한 파도/타마수다레 메들리〉는 일본 특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특유의 춤을 추었다. 부채, 타올 같은 일본적인 오브제, 특히 에도시대부터 전해지는 ‘타마수다레’라는 유희 도구를 갖고 춤추었다. 타마수다레는 펴졌다 접혔다 하며 책처럼 되었다가 튕겨 나가는 용수철처럼 되기도 했다. 기다란 모습으로 파도처럼 출렁이다가 그리고는 또 원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브제가 추는 춤이었다.

|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 〈난양의 색깔〉 ⓒ부산국제무용제 |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Dance Ensemble Singapore)’의 춤, 〈난양의 색깔〉(Colours of Nanyang)의 관람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작품은 중국의 전통결혼식 문화를 보여주었다. 어느 문화에서나 결혼식에서만은 신랑과 신부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 화려한 의식을 치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중국의 결혼식 풍속에서도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화려함이 상상을 불허한다.
결혼식에 쓰이는 소품과 장신구, 장식도 대단하고 복식 차리는 데 긴 시간, 무엇보다 신부의 머리를 치장하는데 실로 오랜 시간이 걸림을 보여준다. 시간의 단축을 위해 앞부분을 보여주고 많은 부분을 설명으로 메우기도 했는데 볼거리가 많아 관객들이 작품에 완전히 몰입되었다.
중국의 전통복장을 한 남자 셋, 여자 넷 외에 여자아이 넷도 출연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전통춤과 중국화된 발레의 숙련된 기량을 보여주며 결혼식을 진행해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에 변화를 주기 위해 스피디한 음악과 함께 의식을 민첩하게 진행했다.
관람 내내, 춤 작품이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춤의 지평을 넓혔다고 보아야 했다.
6월 6, 7일 양일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춤은 필리핀 중서부에 있는 네그로스섬, ‘라 카스텔라나’(La Castellana) 지역에서 온 〈빛의 댄스〉(Bailes de Luces)였다. 역시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춤이었다. 수많은 LED 조명과 빛이 움직이는 것을 춤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러나 우선 흥겨웠다. 춤꾼들이 LED 조명으로 순간순간 빛깔이 바뀌며 번쩍이는 의상을 입고 정열적으로 추는 춤은 관객을 열광시켰다.
이 춤은 라 카스텔라나 지역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갖는 희망을 상징하기 위해, 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본 무용단의 경우는 오브제(objet, 소도구)가 두드러졌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의식(ritual)이었으며 필리핀은 온통 빛(light, LED)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경우를 춤의 확장으로 보아야 했다.

|
이퀼리브리오 디나미코 댄스 컴퍼니 〈봄의 제전, 귀환의 의식〉 ⓒ부산국제무용제 |
이번 공식초청작들 중에서 무용 관계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탈리아 이퀼리브리오 디나미코 댄스 컴퍼니(Equilibrio Dinamico Dance Company)의 〈봄의 제전, 귀환의 의식〉(THE RITE OF SPRING, The Ritual of Return)이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봄의 제전〉은 음악사와 무용사 모두에서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1913년 초, 그가 작곡을 끝내자마자 발레 뤼스(Ballets Russes)의 바슬라브 니진스키가 파리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반(反)발레적인 안무를 함으로써 물의가 빚어졌었다. 그 이후, 야성적이고 파격적인 리듬에 거침없이 전달되는 에너지, 그로 인한 해석의 자유로움으로 ‘봄의 제전’의 안무는 안무가들의 통과의례이자 실험실 그리고 경쟁의 무대가 되어왔다.
내로라하는 여러 무용가가 안무한 가운데서도 피나 바우쉬가 1975년 34세에 안무한 〈봄의 제전〉을 가장 영향력 있는 문제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로베르타 페라라(Roberta Ferrara)가 2024년 1월 피나와 거의 같은 나이에 이탈리아 바리(Bari)에서 초연을 올리고 이번 BIDF 해운대 특설무대에서 공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봄의 제전〉 춤 작품에서 ‘봄을 맞는 이교도들의 원시적 공양(희생)제의’와 ‘대지의 생명력’이 강조되었다면 페라라의 작품에서는 부제 ‘귀환의 의식’(The Ritual of Return)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의 귀환과 부활, 공동체의 의식과 가치, 시간의 주관성 등이 표현되었다. “용장 밑에 졸장 없다”고 그녀 무용단의 남자 셋, 여자 여섯의 젊은 무용수들은 기량도 뛰어났고 안무자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고 있었다.
본래 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연극학을 전공하고 1988년생으로 이제 서른일곱 살이라는 로베르타 페라라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인들과 유럽인들은 탱고에서 의외로 비애를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탱고는 춤추어지는 슬픈 생각이다 / Tango is a sad thought that is danced”는 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탱고는 정열과 섹시함이다. 그래서 “탱고는 두 영혼 사이에서 춤추는 불꽃이다 / Tango is the fire that dances between two souls”라는 말도 있다.
어두운 실내에서 추는 것과는 달리 바다 옆 무대 위에서 남녀가 추는 탱고는 섹시함이 더욱 넘쳤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면서 탱고라이프(Tangolife) 이름 아래 커플로 활동하는 20년 경력의 Nayhara Zeugtrager와 Raphael Giry의 춤은 관객들에게 인기 최고였다.
토니 청과 더 컬렉티브 알앤티에프(Tony Chong and the collective RNTF)의 〈늑대들〉( Wolves)은 캐나다 퀘벡의 무용단 작품이었다. 하지만 안무하고 춤춘 ‘토니 청’이 본래 중국인이고 함께 춤춘 스테판 오코널(Stephen O'Connell)이 미국인이다. 이 작품은 그들 남자 둘이서 춤을 춘다. 좌우로 몸을 흔들며 느린 동작으로 추는 춤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협화음 같으면서도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절제된 행동의 춤으로 인간 내면의 양면성, 선과 악을 나타냈다. 둘은 ‘지킬 박사와 미스터 하이드’를 춤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대학 시절 만났다는 두 사람은 같은 남자 춤꾼으로서 놀라운 앙상블을 이루며 추상적인 내용을 춤으로 표현했다.
십대 네 명의 발레 공연이 있었다. 프랑스 칸 국립무용학교 로젤라하이타워 주니어발레단의 학생 단원들의 공연이었다. 이 무용학교는 마지막 학년에 무대 경험을 쌓게 해, 현실 감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Manon Cardix, Afonso Nunes, Lucresia Panza, William Phibert, 각 남녀 두 명, 모두 네 명이 Serguei Prokofiev 작곡의 로미오와 줄리엣 1막과 모차르트 Concert Piano 21 Adagio를 추었다. 순수함과 풋풋함이 묻어났다.

|
한-프랑스(부산-칸) 공동협력 창제작 프로젝트 〈노 매터〉 ⓒ부산국제무용제 |

|
한-프랑스(부산-칸) 공동협력 창제작 프로젝트 〈하얀 밤〉 ⓒ부산국제무용제 |
폐막작으로 공연된 <하얀 밤>(Nuit Blanche)과 <노 매터>(No Matter)는 올해 BIDF 조직위가 기획해 BIDF와 프랑스의 ‘에르베쿠비 컴퍼니(Compagnie Hervé Koubi)’가 공동협력 창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시킨 작품이다. 즉 한국-프랑스(부산-칸) 협동의 산물이다. 문체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주관하고 있는 ‘2025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Korea-A-Round Culture)’ 사업’에 선정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 중, 한 명이자 춤 창작에 있어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것으로 유명한 에르베 쿠비가 안무한 두 작품은 서로 연결되는 작품이다. 한국의 여성 춤꾼들만을 출연시키는 두 작품은 얼핏 보면 여성들만의 세상, 아마조네스를 그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로테스크한 미장센을 연출한 〈하얀 밤>도 그렇고, 자유분방함과 유머러스함을 보이는 〈No Matter〉
오는 11월 ‘칸 무용페스티벌(Festival de Danse – Cannes Côte d'Azur)’에 초청되어 세계 초연될 예정인 두 작품을 안무자는 그때까지 계속 완성도를 높이면서 무용수들을 연습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두 작품이 칸에서 각광 받는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의 공연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되면 그 또한 이번 제21회 BIDF 조직위의 공적이 될 것이다.

|
부산국제무용제를 즐기는 관객들 ⓒ부산국제무용제 |
공식초청작 중 현대무용 계열의 한국 무용단 넷의 작품은 다수의 젊은 춤꾼들이 출연한 작품들이었다.
시나브로 가슴에(Company SIGA)의 김소연이 안무한 〈앵거〉(Anger)는 남자 춤꾼 2명, 여자 춤꾼 5명이 마치 세찬 파도가 치는 것처럼 춤을 추었다. 한때 유행했던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이 연상되는 무대였다.
정석순 예술감독의 프로젝트 에스(Project S)는 박민지 안무로 〈빌리지〉(Village)를 무대에 올렸다. 젊은이들의 군무로 스피디한 춤에 박진감이 넘쳤다.
시스템 온 퍼블릭 아이(System on Public Eye)의 김지욱이 안무한 〈You should be stronger than me〉 역시 20여 명 젊은 춤꾼들의 힘찬 군무였다. 한 명의 서양 여성 춤꾼이 끼어 있어 이채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최호정 댄스프로젝트 with 부산대(Choi Ho Jeong Dance Project with Busan National University)의 최호정이 안무한 〈PEAK 2.0〉는 40명이 넘는 젊은 춤꾼들의 춤에서 폭발하는 에너지가 엄청났다.
‘춤의 나라, 한국’의 젊은 춤꾼답게 다들 놀라운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네 작품 모두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욕구불만에서 나오는 몸부림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젊음에서 분출되는 힘찬 에너지였다. 한국인들이 갖는 신명과 신바람, 즉 다이너믹스(Dynamics). 특히 그 젊음의 열기와 활기가 무용제 내내 해운대 해변을 가득 채웠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세계의 훌륭한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을 만난 것, 춤의 확장을 목격한 것, 뜻밖에 유연한 리더십을 발견한 것이 즐거운 경험이었다. 현재의 부산국제무용제 규모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었고 공식초청작들의 선정도 훌륭한 조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만주
춤비평가. 시인. 사진작가. 무역업, 건설업 등 여러 직업에 종사했고 ‘터키국영항공 한국 CEO’를 지냈다. 여행작가로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글을 썼고, 사진을 찍었다. 사회성 짙고 문명비평적인 시집 「다시 맺어야 할 사회계약」과 「삼겹살 애가」, 「괴물의 초상」을 출간했다.